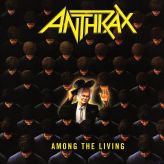Darkest Hour – Darkest Hour –
 Deliver Us (2007) Deliver Us (2007) |
84/100 Jan 6, 2012 |

90년대가 메탈의 침체기였지만, 80년대 못지않게 새로운 장르들도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잠시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미국 외의 지역에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메탈 밴드들이 등장했고 뿐만 아니라, 점차 자신들의 지지기반도 확고하게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유럽이 미국에 비해 메탈씬이 매우 협소했던 것을 상기하면, 오히려 90년대가 유럽 메탈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파워메탈, 프로그레시브메탈, 데스메탈, 고딕, 팝 고딕, 둠 메탈 등 보다 유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들이 발전하였고 여전히 일본 시장에서 잘 나가는 하 드락 밴드들도 적지 않았다. 메탈의 종주국이 미국이 아닌 유럽임이 확고해지게 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지금은 미국 시장도 크게 살아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90년대 말 부터 새로운 물결이 강하게 터지면서 메탈도 본격적으로 모던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중심도 유럽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지금 소개하고자하는 밴드 darkest hour는 미국 밴드임에도 유럽적인 모던스래쉬를 표방하는 밴드이다. 확실히 다키스트 아워는 at the gates와 dark tranquillity 영향이 짙은 음악을 이 앨범에서 선보이고 있고, 어쩌면 그런 것이 이 밴드에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형식의 음악을 들려주지만, 소일 워크나 다케인같은 밴드들에 비해 특별하게 더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굉장히 뛰어난 공격성(?)과 심금을 울리는 서정적 감수성을 이 앨범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다.
첫 곡 Doomsayer는 앨범의 포문을 뜨겁게 열어주는 곡으로 다키스트 아워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들어난 명곡이라 하겠다. 직선적으로 달리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멜로딕컬한 리프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으며 괜찮은 솔로연주도 들려주는 시원시원한 곡이다. 이어지는 Sanctuary도 박력이 넘치지만,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울부짖음과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몸부림을 느낄 수 있는 짧지만 역동적인 곡이다. 기선을 제압하기 안성맞춤인 두 곡이 지나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의 Demon(s)에도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준다. 그리고 An Ethereal Drain로 다시 한 번 시원시원하게 달려준다. 이번 앨범의 특징은 초기작들처럼 거친 느낌을 많이 표현하기 보단, 전작에서 추구하기 시작한 세련미와 서정성을 더욱 보강했다는 점이다. 절에서 맹렬함을 여전히 드러내지만, 좀 더 내면의 서정적 감정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강하다. 그러한 부분은 후렴구에서 잘 나타는데 짧게 간략하게 마무리하기 보단 거기에 할애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음이 분명하다.
참 이 앨범에 대해서보다 2000년대 새롭게 출몰하고 있는 뉴 웨이브 옵 아메리카 헤비메탈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일단 정통 메탈 지지층은 이들을 메탈 밴드로 안 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메탈코어는 진정 현시대의 경향과 새롭게 나타나는 신인들에게 붙여질 수 있을만한 장르명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다키스트 아워의 음악적 형식은 분명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스웨덴 익스트림 메탈 밴드들의 스타일과 다를 것이 없음이 분명하다. 확실히 예술은 시대의 흐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각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17세기에 바로크 음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의 시대였기에 가능하고 18세기에 고전주의가 대두하게 된 것도 18세기였기에 가능하다. 그 시대의 철학,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과학이 그 시대의 예술인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예술은 인간의 고도의 정신적 기술적 집합체인 것이다. 확실히 앞으로 얼마나 새로운 메탈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출몰하고 있는 메탈은 분명 70, 80년대 나왔던 것들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고 70년대 80년대 풍의 메탈이 지구상에 사라진 것도 아닌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차이들이 무엇에 의해 작용되는지 고민해볼만한 문제다. 지금 소개하고있는 다키스트 아워는 분명 펑크 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데스메탈을 연주하는 밴드가 아니며, 얼추 음악을 접해본 경험상 스래쉬메탈과 닮아있지만 당연히 정통 혹은 클래식 스래쉬 메탈은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일지라도 90년대에 등장한 록을 고전록과 구분하기 위해 모던 록이라고 불렀듯이, 그러한 시대적 구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이전 것 하고의 차이가 남을 감안해서 모던 스래쉬 메탈로 부르는 것이 본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 See More 1 like 1 like |
 Sahon – Sahon –
 10 Years In The Battlefield (2011) 10 Years In The Battlefield (2011) |
84/100 Jan 5, 2012 |

스래쉬메탈의 매력이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다수가 본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지도 모르겠다. 속도감 있는 드럼 연주를 초석으로 깔고, 기타 연주자에 의해서 팜 뮤트 상태에서 쏜살같이 갈겨대는 다운피킹 연주와 그런 연주와 함께 어우러져 포효하는 성난 보컬의 목소리에 뭔가 밖으로 시원하게 배설하게 되는 듯한 후련함과 전율이 있음이 분명하다. 틈틈이 체계적으로 적시적소에 터져 나오는 투 베이스 드럼 연주도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더욱 박력있게 만들어주는 감초제 일 것이다. 무작정 달려들 듯 다가오지만 락앤롤함도 살아 있고 정말 공연장에서 관중들이 모슁핏을 형성해서 개슬램하기 좋 은 음악이 스래쉬메탈이 아닌가 생각이든다. 아주 대략적으로 스래쉬메탈의 매력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 소개하고자하는 사혼도 그런 스래쉬메탈의 정석에 제법 충실한 스래쉬메탈을 그 동안 들려주었다.
대한민국 스래쉬메탈 사혼이 3번째 정규 앨범 Brutality Compelled 이후 4년만에 3번째 정규 앨범 10 Years In The Battlefield로 복귀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공백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맴버 변동도 제법 있었고 분명 활동이 순탄해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 밴드의 전성기는 2005년에 EP 앨범 The Feeble Mourning을 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확실히 그 때 밴드 맴버의 기량도 최고조였다고 보고 그럼에도 아쉽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 했고, 3번째 정규 앨범 역시 큰 호응을 얻지 못 했다. 그래도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신고하듯 꽤나 심혈을 기울이고 4번째 정규 앨범을 들고 다시 씬으로 복귀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혼 3집의 단점은 너무 속도에 집착한 나머지 스래쉬메탈 특유의 조직력을 살리지 못 했고 그렇다고 뭔가 강한 인상을 남길만한 명 연주를 들려주지 못 했다. 무작정 빠르게 내 달리는 면에서는 앨범의 주제에는 어쩌면 잘 어울릴지 모르지만, 스래쉬메탈 특유의 박력과 사혼이 기존에 보여주었던 구성력이 사라진 듯 했다. 하드코어스러운 객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라이브에서 소화시키기에는 너무 과하게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3집 곡들의 라이브 연주는 정말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다;;)
사혼은 이번 10주년 기념 앨범이라 할 수 있는 4번째 정규 앨범 10 Years In The Battlefield에서 3집의 과오를 심하게 되풀이 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니깐 라이브에서 제발 백보컬좀 활용하시라고;;) 무작정 달렸던 전작과는 다르게 나름 무너진 조직력을 쇄신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앨범에서 2005년 EP 시절에 함께한 최고 기량의 맴버들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슬레이어에서는 데이비드 롬바르도의 역할이 의외로 컸던 것을 상기해보면 편할 듯하다)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완급조절을 시도해보려는 것을 첫 곡 1000바트에서 감상 할 수 있다. 리프들의 짜임새도 생생히 살아있고, 스래쉬메탈 특유의 박력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무엇보다 곡 중간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전환한 후 비장함까지 잘 살린 기타 연주를 꽤 인상적으로 들려준다. 이런 연주는 이분들의 2집 시절을 곡들을 떠오르게 하기 딱 좋은 대곡이 아닌가 싶다. 첫 곡 보다 더 드세게 몰아치는 Black Blood에서도 여전히 리프들의 탄력이 살아있고 드럼의 블라스트 드러밍 또한 적절하게 잘 활용한 듯하다. 이번 앨범에서는 전작들과 다르게 블라스트 드러밍이 꽤나 곡 분위기를 더 재미나게 만드는데 미들템포로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Get Back Again에서도 그런 면이 확인이 되고, 이 앨범 최고의 곡이라 할 수 있는 살육전쟁에서도 곡의 분위기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 곡의 가사를 우리말로 했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익스트림메탈을 몇 년간 감상했지만, 가사에 신경 쓰는 것 보다 연주에 더 집중했었는데, 과연 헤비메탈도 대중음악으로서의 기능이 없는지 충분히 고민하게 하는 문제다.. 어떤 면에서는 악감정이 지나치게 드러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외층이 느낄 수 있을 법한 감정들을 너무 꾸밈없이 이 앨범에서 토해내고 있다.. 주류층이 강요하는 그런 가치관은 없을지라도 대한민국 99퍼센트가 간혹 가질 수 있는 사회의 부조리함과 분노는 지나치게 특수한 것도 아니며 (특히나 영문 가사를 다시 한글로 개작한 SATAN LOVE ME 분명 개독교들을 신랄하게 조롱하기 좋은 곡이 아닐지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대중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 어쩌면 대한민국 삶 자체가 스래쉬고 살육전쟁인 것이다. 아마 그런 현실을 나름 잘 표현하는 듯해서 이번 사혼 앨범에 어느 해외앨범보다 더 감정이입이 잘 되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세계 메탈씬에서 참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다. 젊고 혈기 왕성한 신예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런 세계의 흐름 속에 이 앨범이 경쟁력이 강한 앨범이라고 말하고 싶은 맘은 없다. 비록 최고 수준의 앨범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맨 위에서 말했듯이 스래쉬메탈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을 괜찮게 이 앨범에서 잘 살린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혼 앨범은 정말 괜찮은 앨범이라고 본다. ... See More |
 Cradle of Filth – Cradle of Filth –
 Dusk... and Her Embrace (1996) Dusk... and Her Embrace (1996) |
96/100 Aug 16, 2011 |

8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익스트림메탈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데스메탈, 극단으로 치달았던 스래쉬메탈 보다 더 강한 음악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신선한 헤비니스를 선사했던 것이 분명하다. 스래쉬메탈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스래쉬메탈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은 분명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두려움과 긴장감이라는 심리를 잘 활용한 거였다. 적어도 인간까지 포함하여 동물이라면, 가장 극단의 두려움을 가지는 때가 죽음 문턱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확실히 데스메탈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들과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새로운 연주법들을 내세웠는지도 모른다. 카니발 콥스같은 스너프 필름이 연상될 법한 고어적인 면 뿐만 아니라, 아니면 디어사이드처럼 종교에서 특히나 잘 묘사하는 무시무시한 사후 세계에 대한 가장 끔찍한 두려움까지 잘 나타내는 부루탈함을 선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전쟁, 초자연적이거나 초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데스메탈 밴드들의 주 소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데스메탈의 사운드는 한편의 공포영화를 연상 시킬 정도로 어둡고,기괴하고 연주 및 악곡 구성도 긴장감을 극한으로 올리는데에 초점이 맞쳐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80년대 아방가르드 스래쉬메탈 밴드 셀틱프로스트에서도 찿아진다. 물론 데스나 시닉처럼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학구적인 밴드들도 함께 등장하였다.
무엇보다 20세기를 마지막으로 향해가는 시기에 걸 맞게, 아니면 갑자기 뒤 바뀐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이상하게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허덕이는 모습이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지의 물결과 라디오헤드같은 브릿팝의 붐도 그런 젊은 층들의 심리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의 다른 한쪽에서는, 80년대 스래쉬메탈과 헤비메탈, 고대 신화에서 중세문학 및 각종 호러소설 뿐만 아니라, 니체나 쇼팬하우어에 대표되는 니힐리즘이나 염세적인 철학에 환장했음을 잘 나타내는 학구적이면서 문학적인 데스메탈 밴드들도 등장했다.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반기독교적 감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들어내며 성당까지 불사르는 블랙메탈도 이 시기에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크래들 옵 필스도, 밴드의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문학적인 데스메탈을 연주하는 밴드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이 밴드의 음악적 정체성은 1994년에 발매된 이들의 데뷔 앨범, The Principle of Evil Made Flesh에서도 확실히 잘 나타나있다.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사운드를 선사했던 이들의 데뷔작은 분명 스웨덴에서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멜로딕데스메탈하고 유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데스/스래쉬적인 연주로 강하게 몰아치는 모습은 세풀투라의 초기시절의 모습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인 툼트나 오비츄어리처럼 어둡게 힘있게 짓누르는 극단의 헤비함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기보단 굉장히 우울하고 고즈넉하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형식이 일반적인 데스메탈 밴드들하고 차이가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전형은 이미 1992년 Edge Of Sanity의 Unorthodox에도 잘 나타나있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키보드 연주를 통해 고딕스럽게 꾸민 정도다. 하지만 이들이 센텐스나 디섹션, 세리온같은 다른 멜로딕데스메탈 밴드들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강력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프론트맨인 대니 필스가 크래들 옵 필스의 강력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뱀파이어의 특징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 블랙메탈 밴드들 보다 더 높게 뻗어나가는 스크리밍과, 그로울링, 허무적이거나 염세적인 클린톤의 목소리까지 자유자제 구사하며 이들의 음악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에 발매된 ep 앨범 Vempire or Dark Fairytales In Phallustein에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완성시키게 된다. 확실히 크래들 옵 필스가 표현하는 굉장히 에로틱하면서, 고뇌에 빠진듯한 뱀파이어의 모습은 그 시대에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와 브레드피트와 톰크루즈의 주연으로 많이 유명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 등장한 흡혈귀들하고 어느정도 매치되는 점이 살짝있다.
이번작은, 크래들 옵 필스의 멜로디 메이킹이 정점에 달해있음을 잘 나타내는 앨범이 아닌가 싶다. 대곡지향적인 모습은 기존의 앨범에서 보여주었던 것 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확실히 연주는 좀 더 유유자적으로 흐른다. 데스메탈에 걸 맞는 긴장감있는 변화를 틈틈히 보여주지만, 너무 급격하지 않으며 특히나 고딕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트레몰로 연주에 발생되는 서정적인 멜로디라인으로 더욱 분위기를 고즈넉하고 우수에차도록 만들었는데, 그러한 모습은 확실히 엣 더 게이츠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1집에서 3집까지의 엣 더 게이츠를 말하는 것 입니다.) 연주는 더욱 거세진 듯 하지만, 그러한 유유자적 흐르는 연주를 통해서 더욱 청자의 내면 깊숙하게 이들의 절규가 전해지는 듯 하다. 특히나 Funeral In Carpathia Dusk and Her Embrace 가 그러한 매력을 십분 잘 활용한 트랙들이 아닌가 싶다. 고딕적인 아름다움은 A Gothic Romance (Red Roses For the Devil's Whore) Malice Through the Looking Glass 더욱 심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 앨범은 점점 더 정점에 올라가버린 크래들 옵 필스의 뛰어난 작곡력을 감상 할 수 있는, 정말 세기의 명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훌륭한 결과물들이 담겨 있음을 각각의 곡들에서 잘 나타난다.마치 먹이를 쫓아가듯 굶주리듯 먹이감을 추적하는 뱀파이어의 맹렬함과,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공허함과 구제될 수 없는 극단의 허무와 우수, 데스메탈이지만 크래들 옵 필스의 두번째 정규 앨범 Dusk and Her Embrace에서 굉장히 멜로딕컬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See More 2 likes 2 likes |
 Dissection – Dissection –
 The Somberlain (1993) The Somberlain (1993) |
88/100 Aug 9, 2011 |

스웨덴의 데스메탈밴드(?) 디섹션의 데뷔앨범이다. 처음에 이들의 앨범을 플레이했을 때, 대충 넘겼지만, 다시 꼼꼼히 들어보니, 정말 이들의 개성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다.
Black Horizons 의 첫 도입부분에 귀에 확 들어오는 블라스트 드러밍. 그리고 계속 그러한 타이트하고 스피드한 전개를 기대했지만, 기대이상과는 다른 진행들을 엿 볼 수 있는, 그나마 스피디한 전개가 조금 부각된 대곡이라 하겠다. 템포조절을 수시로 이어주며, 곡의 흐름을 예측불허의 긴장 상태로 만든다는 점은, 오비츄어리같은 데스메탈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들이 풍기는 오컬트한 기운은 셀틱 프로 스트에 좀 더 가깝다. 이들이 자신들의 음악으로 흑마술의 진수를 들려주겠다고 언뜻 본적 있는데, 데뷔 앨범임에도 조금은 초자연적이면서 약간은 음산하고 어두운 느낌의 멜로디를 계속해서 멋지게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가장 큰 개성이 아닐까한다. 데스메탈 특유의 마이너한 코드 위주가 아닌, 약간은 신경질을 내는 듯 한 차가움과 칼칼함을 시종일관 들려주지만, 그렇다고 블렉메탈 밴드들 처럼 지독한 공격성을 풍기지 않는다. 이는 첫 곡 부터 마지막 곡까지 공격성과 사악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보단 달리는 듯 하다가, 템포 조절 및 리프 운영의 변화를 활용하여 분위기의 전환 및 고조시키며 오컬트함 그 자체 아니면 어떤 비장함을 더욱 부각하려는 곡 진행의 패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곡 진행으로 인해 위압적인면의 지속적인 표출이 확실히 약해진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블렉메탈 밴드들이 데스메탈 밴드들과 다르게 공포감 조성보다는 자신들의 반 기독교적 악감정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스래쉬의 직선적인 공격성을 그대로 이어가며 더욱 악독하게 발전시켰던 점을 감안한다면,(물론 블렉메탈밴드들의 오컬트한 분위기와 공격성 그리고 이미지들은 충분히 공포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악감정 전달에 더 치우친 모습이었음을 이들의 음악에서 감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스래쉬메탈스럽다고 할 수 있다. 직선적인 맛을 더욱 살리기위해, 템포체인지 등의 활용을 많이 절제하고 블라스트드러밍을 논 스톱으로 운영한점과, 스케일이 작은 단음 리프를 연속적으로 배열했다는 점등이 좋은 예가 될 듯 싶다. 물론 사악함과 오컬트함을 강조하는 음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금방 확인 할 수 있다.) 확실히 이 앨범은 멜로딕블렉 보다 멜로딕데스라고 보는 게 더 타당 할 지도 모른다. 이들이 노르웨이 블랙메탈 밴드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음에도, 오컬트한 부분외에 연주 진행상 공통분모가 크게 없고, 그렇다고 같은 스웨덴 출신의 다크퓨녀럴이나 마덕과 같은 행보를 이 앨범에서만큼은 읽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디섹션의 데뷔앨범은 하이포크라시같은 데스메탈 밴드들과 노선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도 엣 더 게이츠나 그 외의 멜로딕데스메탈 밴드들하고 차별성을 가질만한 멜로디메이킹을 이 앨범에서 보여주어, 그래도 괜찮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 See More 2 likes 2 likes |
 Blind Guardian – Blind Guardian –
 Tales from the Twilight World (1990) Tales from the Twilight World (1990) |
92/100 Aug 5, 2011 |

블라인드 가디언의 진면목이 보다 극대화되는, 스피드메탈 메니아라면 절대로 놓쳐서 안 될 필청작임이 분명한, 블라인드 가디언의 3번째 앨범이다.
블라인드 가디언의 가능성은 충분히 전작에서 나타났지만, 이들의 서사적 전개와 남성성을 잘 나타내는 웅장함이 보다 극적으로 변했음을 대곡 Traveler In Time에서 잘 보여준다. 전형적으로 질주하다가도 매절마다 분위기의 전환을 이루는 연주와 오페라가 연상될 법한 폐기 넘치는 코러스의 활용, 중세 포크적인 아르페지오의 첨가등등이 이들의 서사적이고 에픽적인 환타스틱함을 더욱 강조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모습은 두 번째 곡 W elcome To Dying에서도 잘 이어가며, 특히나 전작의 바할라와 마찬가지로 카이한센의 보컬 참여가 돋보이는 Lost In The Twilight Hall에 더욱 빛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ast Candle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블라인드 가디언의 환타스틱한 스피드메탈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명곡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이들의 중세적 아름다움은, 이들이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환장했음을 대놓고 나타내는 발라드트랙 Lord Of The Rings에서도 감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라인드 가디언은 이 앨범을 통해 자신들의 개성을 보다 구체화 시킴으로 확실히 헬로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음이 분명하다. ... See More 2 likes 2 likes |
 callrain's profile
callrain's profile

 Darkest Hour –
Darkest Hour –
 Deliver Us (2007)
Deliver Us (2007) 90년대가 메탈의 침체기였지만, 80년대 못지않게 새로운 장르들도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잠시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미국 외의 지역에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메탈 밴드들이 등장했고 뿐만 아니라, 점차 자신들의 지지기반도 확고하게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유럽이 미국에 비해 메탈씬이 매우 협소했던 것을 상기하면, 오히려 90년대가 유럽 메탈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파워메탈, 프로그레시브메탈, 데스메탈, 고딕, 팝 고딕, 둠 메탈 등 보다 유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들이 발전하였고 여전히 일본 시장에서 잘 나가는 하 ... See More
90년대가 메탈의 침체기였지만, 80년대 못지않게 새로운 장르들도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잠시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미국 외의 지역에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메탈 밴드들이 등장했고 뿐만 아니라, 점차 자신들의 지지기반도 확고하게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유럽이 미국에 비해 메탈씬이 매우 협소했던 것을 상기하면, 오히려 90년대가 유럽 메탈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파워메탈, 프로그레시브메탈, 데스메탈, 고딕, 팝 고딕, 둠 메탈 등 보다 유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들이 발전하였고 여전히 일본 시장에서 잘 나가는 하 ... See More 1 like
1 like Sahon –
Sahon –
 10 Years In The Battlefield (2011)
10 Years In The Battlefield (2011) 스래쉬메탈의 매력이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다수가 본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지도 모르겠다. 속도감 있는 드럼 연주를 초석으로 깔고, 기타 연주자에 의해서 팜 뮤트 상태에서 쏜살같이 갈겨대는 다운피킹 연주와 그런 연주와 함께 어우러져 포효하는 성난 보컬의 목소리에 뭔가 밖으로 시원하게 배설하게 되는 듯한 후련함과 전율이 있음이 분명하다. 틈틈이 체계적으로 적시적소에 터져 나오는 투 베이스 드럼 연주도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더욱 박력있게 만들어주는 감초제 일 것이다. 무작정 달려들 듯 다가오지만 락앤롤함도 살아 있고 정말 공연장에서 관중들이 모슁핏을 형성해서 개슬램하기 좋 ... See More
스래쉬메탈의 매력이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다수가 본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지도 모르겠다. 속도감 있는 드럼 연주를 초석으로 깔고, 기타 연주자에 의해서 팜 뮤트 상태에서 쏜살같이 갈겨대는 다운피킹 연주와 그런 연주와 함께 어우러져 포효하는 성난 보컬의 목소리에 뭔가 밖으로 시원하게 배설하게 되는 듯한 후련함과 전율이 있음이 분명하다. 틈틈이 체계적으로 적시적소에 터져 나오는 투 베이스 드럼 연주도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더욱 박력있게 만들어주는 감초제 일 것이다. 무작정 달려들 듯 다가오지만 락앤롤함도 살아 있고 정말 공연장에서 관중들이 모슁핏을 형성해서 개슬램하기 좋 ... See More
 Cradle of Filth –
Cradle of Filth –
 Dusk... and Her Embrace (1996)
Dusk... and Her Embrace (1996) 8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익스트림메탈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데스메탈, 극단으로 치달았던 스래쉬메탈 보다 더 강한 음악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신선한 헤비니스를 선사했던 것이 분명하다. 스래쉬메탈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스래쉬메탈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은 분명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두려움과 긴장감이라는 심리를 잘 활용한 거였다. 적어도 인간까지 포함하여 동물이라면, 가장 극단의 두려움을 가지는 때가 죽음 문턱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확실히 데스메탈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들과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 See More
8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익스트림메탈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데스메탈, 극단으로 치달았던 스래쉬메탈 보다 더 강한 음악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신선한 헤비니스를 선사했던 것이 분명하다. 스래쉬메탈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스래쉬메탈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은 분명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두려움과 긴장감이라는 심리를 잘 활용한 거였다. 적어도 인간까지 포함하여 동물이라면, 가장 극단의 두려움을 가지는 때가 죽음 문턱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확실히 데스메탈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들과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 See More 2 likes
2 likes Dissection –
Dissection –
 The Somberlain (1993)
The Somberlain (1993) 스웨덴의 데스메탈밴드(?) 디섹션의 데뷔앨범이다. 처음에 이들의 앨범을 플레이했을 때, 대충 넘겼지만, 다시 꼼꼼히 들어보니, 정말 이들의 개성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다.
스웨덴의 데스메탈밴드(?) 디섹션의 데뷔앨범이다. 처음에 이들의 앨범을 플레이했을 때, 대충 넘겼지만, 다시 꼼꼼히 들어보니, 정말 이들의 개성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다.  2 likes
2 likes Blind Guardian –
Blind Guardian –
 Tales from the Twilight World (1990)
Tales from the Twilight World (1990) 블라인드 가디언의 진면목이 보다 극대화되는, 스피드메탈 메니아라면 절대로 놓쳐서 안 될 필청작임이 분명한, 블라인드 가디언의 3번째 앨범이다.
블라인드 가디언의 진면목이 보다 극대화되는, 스피드메탈 메니아라면 절대로 놓쳐서 안 될 필청작임이 분명한, 블라인드 가디언의 3번째 앨범이다.  2 likes
2 likes
 Blind Guardian –
Blind Guardian –
 Imaginations from the Other Side (1995)
Imaginations from the Other Side (1995) 2 likes
2 likes
 Manticora –
Manticora –
 The Black Circus Part 2 - Disclosure (2007)
The Black Circus Part 2 - Disclosure (2007)

 Manticora –
Manticora –
 The Black Circus Part 1 - Letters (2006)
The Black Circus Part 1 - Letters (2006)

 Manticora –
Manticora –
 8 Deadly Sins (2004)
8 Deadly Sins (2004)

 Manticora –
Manticora –
 Hyperion (2002)
Hyperion (2002)

 Manticora –
Manticora –
 Darkness with Tales to Tell (2001)
Darkness with Tales to Tell (2001)

 Manticora –
Manticora –
 Roots Of Eternity (1999)
Roots Of Eternity (1999)

 Agent Steel –
Agent Steel –
 Order of the Illuminati (2003)
Order of the Illuminati (2003) 1 like
1 like
 Agent Steel –
Agent Steel –
 Omega Conspiracy (1999)
Omega Conspiracy (1999)

 Annihilator –
Annihilator –
 Metal (2007)
Metal (2007)